|
|
나는 지금 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. 손자라는 말만 들어도 내 얼굴에 미소가 떠 오름은, 그 해해대는 웃음소리, 아장아장 걸음걸이, 연한 풀잎같은 살의 감촉, 향기로운 젖내음의 기억 때문이리라. 이런 특징들을 안 가진 아이들이 어디 있겠느냐만 그 모든 공통점 위에 ‘내 피붙이’라고 하니 더 사랑스러워 진다. 이 손자가 식구들과 같이 내일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 우리 집에 오는 것이다. 내가 처음부터 손자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은 아니다. 아니, 한 때는 오히려 귀챦은
존재로 여기기도 했다.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남으로 해서 내가 ‘할아버지’라는
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억울했다.
자녀가 장성해서 혼인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큰 복이라는 것을 내가 왜 모르랴.
그러나 내 경우에 이건 너무 이르다. 딸이 일찍 연애결혼을 하고는 바로 다음 해에
출산을 했는데, 그런데 내가 갑자기 ‘할아버지’라는 감투(?)를 강제로 써야 한단다. 거의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근무해온 나는 일에 도가 텃다고나 할까, 예술가가 예술하듯 그렇게 즐기며 일을 하고 있다. 굴곡과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길이었지만 그래도 무사고 운전수처럼 살아 온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닥친 ‘할아버지’ 칭호는 마치 뒤에서 쫒아오는 순찰차의 빨강 파랑 경고등 같이 섬찟하게 만들었다. 인생이란, 세상에 태어나면 ‘아기’라는 호칭이 붙는다. 그 후 ‘어린이’, ‘소년’, ‘청년’,
‘장년’, ‘중년’, 그리고 ‘노년’ 으로 넘어 간다. 이 ‘노년’의 대명사가 ‘할아버지’가 아닌가?
‘할아버지’ 다음에는 다만 무덤이 있을 뿐이다. 그렇다면 내 인생도 벌써 종막이란 말인가?
딸이 혼인식을 올린지 일년도 안 되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“어, 그렇게 빨리?” 한
것도 아마 이런 연유때문일 것이다. 얼마 후 해산했다는 전화가 왔다. 내가 ‘할아버지’가 되었다고 주위에서는 얼마나
기쁘냐고 축하해 주었지만 나는 그저 어설픈 웃음만을 얼굴에 그릴 뿐이었다. 곧 우리 내외는 서울에 가서 나의 첫 손자와 첫 대면을 했다.
“자, 네 할아버지시다.”
딸이 자랑스럽게 아기를 내 품에 안겼다. 발버둥치며 우는 이 간난쟁이를 어떻게
얼러야 할지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그저 쩔쩔매기만 했다.
“아빠, 애기 예쁘죠?”
딸이 다그쳐 묻는다.
“응, 그렇구나.” 나는 우물우물 얼버무렸다. 아직도 빨간 피부에 뼈가 연해서 기형적으로 길다란 머리통이 영화에서 본 우주인
같았다. 요모조모 아무리 뜯어보아도 별로 예쁜 구석을 찾을 수가 없다. 눈치 빠른
아내가 아기를 내게서 빼앗듯 안았다. 주윗 사람들이 이 놈을 보며 예뻐 죽겠다는
몸짓들인데 나만 엉거주춤 서 있기만 했다. 한 이 년 쯤 지났다. 서울에 출장을 가는데 아내는 애기를 보겠다고 같이 동행했다.
이제는 많이 자라서 제법 걸어다니고 재롱도 부려 친척들에게서 사랑을 독차지하고
있었다. 그 놈이 나를 부를 때는 “할부지” “할부지”한다.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
쑥스럽고 싫었다. “할부지”를 연발하는 이 놈에게 영 정이 가지 않음은 물론이다. 이런 나를 180도 변하게 하는 사건이 생겼다.
어느 날 저녁 식사 후였다. 사위는 아직 직장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내와 딸이 밖에
나가며 찬거리 사러가니 그 동안 아기를 보고 있으란다. 이 놈은 아기침대에서 쌔근쌔근
잠들어 있었다. 나는 읽던 책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손짓으로 다녀오라고 했다. 그들이
나가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. 나는 독서에 깊이 빠져들었다. 얼마를 지났을까 갑자기 속이 거북해지더니 배가 빵빵해지고 방귀가 뀌고 싶어졌다.
아무도 없는 집안이라 나는 거리낌 없이 “부-웅” 시원하게 방사를 했다. 그 소리가 나고
1-2초나 되었을까? 저 쪽 아기침대에서 “부-욱”하는 소리가 났다.
“무슨 소리지?”
나는 책을 놓고 아기가 누운 곳으로 갔다. 언제 깨었는지 나를 쳐다보며 방글거리지
않는가? 요 녀석이 내 방귀 소리를 흉내낸 것이었다. 흉내쟁이 요 놈을 번쩍 안아들고
“부-욱”하니 그 조그만 입이 맞 받아 “부-욱”한다. 꼬마와 나는 연신 “부-욱”, “부-욱”하며
깔깔 해해대고 웃었다. 처음으로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. 나는 몸을 구푸려 엎드려서 이 애를 등에 태웠다. 그리고 기어서
안방, 건넌방을 돌아 다녔다. 빨리도 가고 천천히도 가고, 높이도 기고 얕이도 기면서.
등 위에서 녀석은 연신 “부-욱” “부-욱”하면서 몸을 흔들었다. 어느 사이에 이 놈이
등에서 목으로 올라와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꽈악 움켜잡고 역마잡이로 가잔다.
이 제는 속력을 내도 떨어질 염려가 없다. 우리는 둘이 한 몸 처럼 되어 마구 달렸다. 얼마가 지났을까. 아내와 딸이 문 열고 들어오다가 눈이 둥그래졌다. 우리는 둘이 다
온 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고 내 머리는 마구 흐트러져 있었다. 자초지종을 이야기
해 주었더니 두 모녀가 배를 잡고 깔깔 웃는다. 딸이 녀석을 안고 “부-욱”하니 이 놈이
나를 가리키며 “부-욱”한다. 그럴 때마다 집안은 온통 웃음천지가 되었다. 그때부터
나는 방귀 잘 뀌는 ‘부-욱 할아버지’가 되었다. 며칠 후 우리 내외는 미국으로 돌아왔다. 그 후에도 이 녀석은 벽에 걸린 가족사진
속에서 나를 가리키며 “부-욱” 한단다. ‘부-욱’, ‘부-욱’하며 할아버지를 찾는다는 소리를
들으면 나 또한 보고싶어 지며 그 저녁처럼 다시 손자를 태우고 부-욱거리며 이 방 저 방
돌아다니고 싶다. 그 녀석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. IMF한파로 사위 사업이 여의치 않아 온 식구가
미국에 정착하기로 했단다. 사위가 뉴욕에서 자리를 잡을 동안 딸과 아기는 우리 집에
있기로 했다.
우리는 전에 딸이 쓰던 방을 치우고 세간을 옮겨놓고 아기침대를 장만하며 새 식구
맞을 준비를 했다. 사실 나는 딸 사위보다도 손자가 온다는 사실에 더 흥분해 있다.
‘이 손자놈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갈까’, ‘무엇을 사 줄까’.
십여년을 이 동네에 살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
그네랑 미끄럼틀도 조사해보고 꾸불꾸불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손자와 숨기놀이하는
장면을 그려 보기도 한다. 이 첫 손자를 기다리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본다.
일욕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일을 벌려 놓고 숨을 헐떡이며 뛰 듯 살아 온 나였다.
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 산업이 한창 발전하던 시기에 누구나 그랬듯이 나의 생활이란게 온통
회사 위주, 일 위주였다. 일이 끝나도 사원들간의 회식이나 친구 모임들 때문에 집 문을
두드리는 시간은 거의 매일 자정 안팎이었다. 자연히 식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항상 우선순위 맨 뒤로 말리곤 했다. 지금 생각하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기를 그냥 지나쳐 오지
않았나 하는 회의가 생긴다. 마치 밤길을 걷다가 발에 채인 금 덩어리를 돌이려니 지나친
사람처럼. 책상에 앉아 내 달력의 행사표를 점검해 본다. 이대로라면 너무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서
손자와 같이 놀 시간을 거의 낼 수가 없다.
다시 짜야겠다. 일을 줄이고 휴일에는 손자와의 시간을 우선 정해 놓고 나머지 일정을 짜면 어떨까.
손자가 “할아버지”하고 부를 때마다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라는 경종으로 받아 들이자.
학교에서 종이 울리면 일 교시가 끝나고 이 교시가 시작된다. “할아버지”하는 손자의
부름을 내 인생의 종소리로 받아들이자. 첫 시간 끝나는 종이 울렸다 해서 학교가 다
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. 다만 머리를 돌려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라는 신호일 뿐이다.
하나님께서 손자를 통해 주시는 이 ‘때’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리라 다짐한다.
1998.7
|




| 
|
 차문환
차문환
2013-11-15 10:32
|
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세요. 오시면 좋은 글이 많이 나오겠지요? |
|



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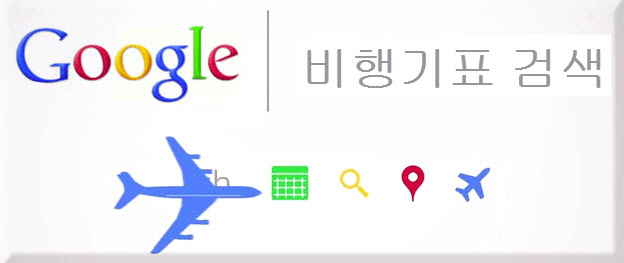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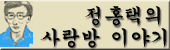
 주요 메뉴
주요 메뉴








